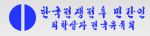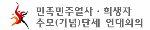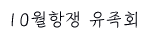미국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 받은 오멸 감독 인터뷰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이 역사를 모두가 알고 있다면 영화로 찍을 필요가 없었겠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재인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지슬'을 만든 오멸 감독은 연출 의도를 이렇게 정리했다.
제주 4·3이라는 현대사의 비극을 감동적인 이야기와 뛰어난 영상미로 스크린에 구현한 이 영화는 지난달 세계 최고 권위의 독립영화 축제인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지난달 말 귀국하자마자 다시 네덜란드 로테르담국제영화제와 프랑스 브졸국제아시아영화제에 초청받아 출국한 오멸 감독은 며칠 전에야 한국에 들어왔다. 브졸아시아영화제에서도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최고상인 황금수레바퀴상을 받았다.
바쁜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온 오 감독을 19일 종로구 계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이 영화를 만들 생각을 언제부터 품어왔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싹튼 생각입니다. 내 이야기이고 언젠가는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제주 4·3은 한반도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미군정의 통치를 받던 끝 무렵인 1948년 제주에서 벌어진 끔찍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3만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섬이라는 고립된 지역의 특성과 좌·우 이념 갈등 속에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역사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집집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그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 4.3은 제주 사람들도 입에 잘 올리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집안에서도 큰 고모님이 그 당시 돌아가셨다는 걸 작년에야 알게 됐어요. 어른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얘기라 그제야 듣게 됐죠."
영화는 일련의 참사 가운데 그 해 11월 산속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발각돼 몰살당한 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학살) 사건이 워낙 많고 잔인했고, 수많은 사람이 행방불명됐지만, 영화에서 다룬 사건은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극히 일부죠. 그 동굴은 실제로 답사 때문에 갔다가 시대의 아이러니 같은 상황을 느끼게 돼서 이야기에 중심으로 끌어들었어요. 영화가 죽음이나 아픔, 통증을 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동굴에 피난온 이들을 떠올리게 됐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부랴부랴 산으로 피난을 떠난 사람들은 답답한 동굴에서 굶주림에 지쳐가면서도 몇 알의 감자를 나눠 먹으며 집에 두고 온 돼지 걱정을 하고 소소한 농담을 주고 받는다. 영화 제목 '지슬'은 제주 방언으로 감자를 뜻한다. 감자는 이 영화에서 사랑과 따뜻함, 슬픔을 모두 응축한 핵심 상징으로 등장한다.
"감자는 전 세계인의 '솔 푸드(soul food)' 아니냐 생각했죠. 굶주릴 때, 어려운 시대를 지탱하게 해주는 감자, 그 정서가 전 세계와 공감하지 않겠나 싶었어요."
 |
아픈 역사를 다루면서도 영화는 특별히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다. 극 중 민간인을 무참하게 죽이는 군인들의 우두머리가 마약에 취해 있는 장면은 그들 역시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마약이 어디서 나왔을까 질문해 보면, 일본군이 남기고 간 것이거든요. 1945년에 해방되면서 일제 징용을 경험한 사람들, 2차대전에서 여기저기 전쟁에 끌려 다니면서 피비린내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마약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역사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공간(제주)에 들어오고 약에 취해서 살육의 현장에 있는 그런 배경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영화는 흑백이어서 더 비장하다. 촬영할 때는 다른 영화들처럼 컬러 디지털카메라로 찍었지만, 후반 작업에서 일부러 색을 빼 흑백으로 만들었다.
"제 전공이 한국화여서 흑백 표현에 익숙합니다. 또 제주가 워낙 아름다운 풍경으로 뒤덮여 있고 최고의 관광지로 여겨지다 보니 사람들이 그 안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슬픔을 묘사하는데 색을 빼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독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이 제주 4.3의 역사를 잘 모르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역사교과서에서도 현대사 부분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에 그렇게 큰 상처가 없었고 6·25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도 역사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빨갱이다, 폭도다' 이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주에는 아직 분노에 찬 사람이 많지만, (바깥에서는) 우리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배우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 역사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
감독의 집 보증금을 빼고 주변 지인들과 뜻있는 제주인들의 후원금을 합쳐 2억5천만 원으로 영화를 시작했지만, 영화를 만들 때만 해도 제주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4.3의 역사를 다룬다는 부담감은 컸기에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더 어려웠다.
"제주에서는 4.3을 영화로 잘 다뤘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큰데, 그 기대를 해결할 능력(제작비)은 안 주니까 '어쩌란 말이냐' 싶었죠. 그 오래된 숙제를 해결할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영화가 국내외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서 제주 사람들의 기대도 점점 커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아직 많이 얘기를 나누지 못한 상태지만,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들 좋아하고 반가워하더군요. 제주 사람들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맺힌 것들이 다시 꿈틀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슬'은 제주에서 오는 3월 1일 먼저 개봉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3월 21일부터 상영한다.
감독이 해외 영화제에서 가장 많이 받았다는 질문은 이 영화의 의미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미국이나 유럽 관객들이 물어보는 게 '한국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였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런 영화로 만들어졌을까 하는 궁금함을 갖게 되나봐요."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20 06: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