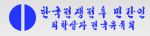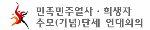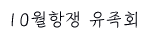[김지혜의 논픽션] 최종편집 : 2013-04-05 11:28:50

* 본 글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SBS E!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한국 영화 최초로 미국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는 쾌거를 올린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이하 '지슬')이 극장가에서 작은 영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3월 1일 제주도에서 선개봉한 뒤 전국 개봉한 '지슬'은 지난 5일까지 전국 7만 4,228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천만 영화가 한 해에 두 편이나 나오는 한국 영화 호황 속에서 7만이라는 숫자가 하찮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슬'이 담고 있는 묵직한 메시지와 2억 5천만 원이라는 작은 제작비로 완벽에 가까운 미장센을 완성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다.
'지슬'은 1948년 제주섬 사람들이 '해안선 5km 밖 모든 사람은 폭도로 간주한다'는 미군정 소개령을 듣고 피난길에 오르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한국 근대사의 비극인 4.3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피난길에 오르는 순박한 제주 도민과 실체 없는 빨갱이 축출에 괴물이 되어버린 군인의 대비가 돋보이는 '지슬'에는 초반부터 끝까지 관객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캐릭터 한 명이 등장한다. 바로 '주정길'이라는 군인 캐릭터다. 제주 도민을 학살하기 위해 마을에 파견된 군인 중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양심을 지킨다.
'지슬'은 신위, 신묘, 음복, 소지에 이르는 제사의 4가지 형식을 소제목으로 구성했다. 정길은 챕터가 시작되는 첫 장면마다 물동이를 지고 마을을 지나간다.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길은 군모를 눈 아래까지 내려쓰고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마을이 초토화되고, 주민이 학살되는 잔혹한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카메라는 정길의 슬픈 얼굴을 슬로우 모션으로 잡아낸다. 그는 비극의 현장에 서서 표정만으로 충격과 슬픔을 표현한다.
영화 중반까지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장면은 없다. 극중 일어나는 사건 대부분을 지켜보며 방관자적 시선을 유지한다. 때문에 정길이 극중 등장 인물인지 아니면 감독의 자아가 투영된 제3의 인물인지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신이 두번 정도 등장한다. 인상적인 장면은 민간인 학살을 주도하는 하사관을 산채로 가마솥에 넣어버리는 신이다. 그는 솥에 불을 지피며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이제 그만 죽이고 잘 가세요"라고 말한다. 비극을 주도하는 가해자에 대한 정길 만의 단죄 의식인 것이다.
놀라운 것은 정길 역을 맡은 배우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점이다. 더욱이 직업 배우도 아닌 '지슬'의 연출부 중 한 명이다. 영화사 진진의 관계자는 "'정길'역을 맡은 배우는 '지슬'의 연출부에서 작업을 도왔던 주정애라는 스태프다. 촬영 중 오멸 감독의 부탁을 받고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멸 감독은 3월 15일 열린 '관객과의 대화'에서 "'정길'은 실제로 여자다. 정길에게 '설문대 할망'이라는 제주도 신화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싶었다. 설문대 할망은 500명의 아이를 낳은 거인인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죽을 끓인다. 그런데 힘에 부쳐서 솥에 빠지고 만다. 그래서 아이들은 고기죽을 먹게 된다"며 정길에게 투영한 신화의 이미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길이 계속 물을 길어다 놓는 자리가 바로 그 솥이고, 솥 안에 돼지를 삶아서 먹기도 하고, 김 상사가 요람처럼 목욕을 하기도 한다. 어쩌면 김 상사도 설문대 할망이 품어야 하는 또 하나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했다. 정길은 군인과 주민을 함께 체감하는 인물로 그렸다. 그 안에 있으려면 여자라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데, 나는 동네 오빠를 쫓아다니다 전쟁통에 갈 데가 없어서 군복을 입고 들어온 캐릭터로 잡았다"고 덧붙여 말했다.
결국 '정길'이라는 캐릭터는 감독의 시선인 동시에 관객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슬' 속 모든 캐릭터는 직면한 상황에 맞서며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됐다. 그러나 정길은 가해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린다.
마찬가지로 관객은 지나간 역사에 관여할 수 없다. 그저 지켜보며 분노하고 아파할 뿐이다. 그리고 애써 알려고 하지 않았던 역사를 돌이켜보며,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만큼은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ebad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