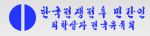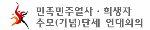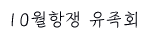[아침을 열며] 경향신문 조운찬 문화부장 입력 : 2013-04-14 21:24:04ㅣ수정 : 2013-04-15 00:29:55
지난 주 한 편의 영화를 보고, 한 권의 소설을 읽었다. 오멸 감독의 <지슬>을 본 것은 1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한 날이었는데, 그즈음 출판사 창비에서 보내온 공선옥의 신작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를 읽고 있었다.
영화 <지슬>은 1948년 제주 4·3항쟁 이후에 일어난 군경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영화를 보고나면 제주의 아름다운 산과 들에 제주사람들의 핏빛 절규가 배어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제주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줄곧 제주의 역사, 문화를 영상에 담아온 ‘제주 사람’ 오멸 감독의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그가 제주 4·3을 영화화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이어도>에서 4·3을 주제로 다뤘으며 선배 김경률 감독과 함께 4·3을 본격 조명한 <끝나지 않은 세월>을 스크린에 올리기도 했다.

공선옥 작가의 소설 <그 노래는…>은 1970~1980년대를 살아간 한국 기층여성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중반 시골마을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남자들의 성폭력, 국가의 공권력으로 찢겨나간다. 가난, 절도, 차별, 성폭력이 만연하는 그곳에서 마을공동체의 안온함은 찾아볼 수 없다. 문제는 이들이 도시로 밀려난 뒤에도 사회적·시대적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 폭력은 오히려 더 심화되는데, 그 중심에 ‘5월 광주’가 놓여 있다. 공선옥은 전남 곡성에서 태어나 고교 1년 때 5·18을 몸으로 겪은 ‘남도사람’이다. 당연히 1980년 광주항쟁과 학살은 그녀의 문학 원형질이다. <그 노래는…> 속의 여성들 이야기에는 자신의 기억도 담겨 있을 것이다.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으며 든 의문은, 그들은 왜 반복해서 4·3과 5·18을 얘기하는 것일까였다. 두 사건이 작품의 좋은 소재여서? 아니면 그들이 사건의 고장 출신이어서? 아니면 역사적 사명감 때문에? 두 작가의 이력과 언론 인터뷰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본 뒤 내린 대답은 ‘기억’이었다.
오멸 감독은 <지슬>이 개봉 13일 만에 제주에서 1만 관객을 돌파하자 감격스러운 듯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목표하는 전국 3만 관객은 구천을 떠돌 당시 영령들의 걸음이며 섬의 울음이기도 하다. 그 울음소리를 세상이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후예들의 걸음이다.” 제주 사람인 그에게 제주 4·3은 집단기억이자 추체험된 과거다. 비록 그가 목격하지 못했지만 유년기부터 부모와 이웃에게서 들은 4·3 학살의 실상은 경험자들 못지않게 강렬했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오랫동안 외면했다. 사건은 2003년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가 발표된 뒤에야 ‘봉인해제’됐다. 역사가에 의한 4·3의 역사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오멸 감독은 제주인들의 기억을 불러내 쓰이지 못한 제주의 역사를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광주항쟁은 제주 4·3보다 연대에서 뒤지지만 더 일찍 역사의 조명을 받은 사건이다. 민주화의 붐을 타고 전두환·노태우 등 학살의 주체에 대해서는 일부 단죄가 이뤄졌으며,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예도 회복됐다. 공선옥뿐 아니라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소설, 시, 연극으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26년>이 상영됐다.
공선옥의 소설에는 해원되지 못한 여성들의 한이 두껍게 깔려 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 한의 응어리를 그들은 주문과 같은 노래로 주절댈 뿐이다. 그는 왜 ‘광주’를 쓰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때가 여전히 생생해요. 약한 이들의 노래를 잊으려는 마음이 승할수록 세상의 폭력이 더 강화돼요. 폭력에 무감각한 사회,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것이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5·18 소설’은 허구가 아니라 씻겨지지 않는 기억의 침전물이다.
기억이란 과거의 경험을 간직하거나 드러내는 일을 말한다. 대개 개인의 기억은 감성적이며 임시적이고 비체계적이다. 그러나 기억이 사회적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은 역사가 될 수 있다. 개인의 기억도구가 사진첩이나 편지, 메모리칩이라면 공공의 기억장치는 기념비와 박물관 등이 될 것이다. ‘동학농민운동’이 교과서에 오르기까지에는 기념사업 추진 같은 민간의 노력이 선행되었음을 떠올려봐라. 공공기억은 이러한 장치를 통해 공식의 ‘역사’에 저항하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간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집단기억이 역사를 새로 쓰게 한 대표적인 사례다.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기억을 역사쓰기에 적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기억전쟁’ ‘기억정치’ ‘기억투쟁’ 등의 용어도 자주 쓰인다. 기억 문제를 탐구해온 미국 캘리포니아 세인트메리대의 중국인 교수 쉬펀은 공공기억이 역사를 성찰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은 무슨 이유로 기억하는가>라는 책에서 공공기억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책임의식에서 나오며 도덕과 윤리를 지켜주는 장치라고도 썼다. 그렇다면 공공의 기억을 함께 나누는 일은 인류의 존엄을 지키고 공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번주는 4·19이고, 내달은 5·1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