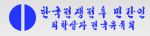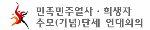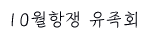이번 1월9일 시사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기자들에 대한 충격적인 테러 직후 프랑스와 서방 사람들은 “나는 샤를리다”라고 공감과 지지를 표시했다. 150만의 시민이 대규모 반테러 시위에 참가했고, 프랑스 총리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의 허용 한계, 혹은 ‘문명의 충돌’ 등으로 설명하지만 나는 프랑스 출신 한 런던대학 교수가 말한 ‘야만주의의 충돌’ 명제가 더 다가왔고, 한 걸음 나아가 이것은 ‘무신경하고 오만한 서구 급진적 자유주의와 제3세계의 충돌’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을 한다. 그것은 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인류의 공통 자산을 부정해서도 아니고, 샤를리 에브도 기자들의 반권위주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아서도 아니며,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테러 전략을 옹호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나는 샤를리다”라는 서방의 연대전선은, 미국에서의 9·11 테러 직후 <르몽드>가 “우리는 모두 미국 시민이다”라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에 맞서자는 연대 의사를 표시한 일이나, 1963년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베를린을 방문하여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라고 동독 공산주의에 맞서는 서독에 연대를 표시하여 환영을 받았던 일을 연상시킨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국가는 ‘자유’라는 기치 아래 과거에는 공산주의라는 ‘악마’와 맞섰다면, 지금은 테러세력이라는 ‘악마’에 맞서는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이 반공에서 반테러로 이어지는 서방 연대에는 선교사 제국주의, 미국의 남미 독재정권 지원, 중동 석유 장악을 위한 영·미의 개입,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후원 등의 치부는 물론 주류 백인들의 인종주의와 자국 내 제3세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 역사는 완전히 묻혀 버린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제국주의와 독재의 사슬에서 신음했던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 복음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영국이 식민지를 포기한 지 한참 뒤인 1960년대 초까지 알제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물러갈 때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현지 대리자들을 통해 수많은 피억압 주민들에게 폭력과 학살을 자행하였다. 공산주의라는 야만에 맞서자던 케네디는 쿠바를 침공하였고, ‘자유’의 이름으로 베트남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물론 샤를리 에브도는 반전운동을 했던 68운동의 주역들이 운영했다. 그러나 오늘 프랑스에 살고 있는 500만 무슬림이 왜 프랑스로 오게 되었는지, 그들이 내부의 소수자로서 겪고 있는 낙인과 차별에 대해 이 매체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지는 의심스럽다. 수백년 전 절대왕조를 향해 그들의 조상들이 부르짖었던 ‘표현의 자유’는 목숨을 각오한 용기를 필요로 했지만, 오늘 문화적 기득권층이 된 그들이 ‘저주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종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도 ‘용기’의 일종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테러 이후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 이슬람 교당에 대한 폭력 행사가 나타났고, 극우파가 득세하는 한편,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여러 나라나 파키스탄에서 교회를 파괴하거나 반대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오만한 ‘자유’는 폭력을 낳고 오히려 근본주의를 부추긴다. 지난 2세기 이상 서방이 누린 자유와 풍요는 문명이라는 이름의 야만 통치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반테러 전쟁’을 선포한 서방 진영이 잊어서는 안 된다.
|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테러세력의 배후를 캐자는 ‘음모론’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기득권 세력의 한계다. 평범했던 젊은이들을 테러범으로 만든 것은 바로 프랑스 사회의 과거와 현재다. 과거 식민지 원주민의 자식들이 이제 내부 식민지 주민이 된 오늘,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이주민이 되기보다는 비참한 원주민이 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이들이 ‘이등 시민’으로서 잔인하게 체험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테러는 지속될 것이다. 독을 독으로 제거하려 하면 생명체는 죽는다. 종교적 근본주의만큼이나 급진 자유주의도 서구 문명의 치부를 드러내 준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