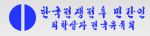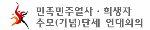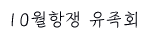등록 : 2015.01.16 18:50
 |
서해성 소설가 |
그해 겨울에는 용산 남일당 옥상이 고향이었다. 삼촌네들의 고향은 불이 붙은 채 사그라져 갔다. 불꽃 속에서 그 고향이 남긴 말은 한마디였다. 여기 사람 있어요. 그 말이 들리는 고막을 지닌 사람과 안 들리는 청각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이 나뉜 지 꼭 여섯 해가 되었다.
작년에는 송전탑 꼭대기가 고향이었다. 할머니들의 고향은 고압선에서 말라붙어 버렸다. 끌려가지 않기 위해 몸을 쇠사슬로 묶고 땅을 파고 내려간 밀양 할머니들은 옷이 다 찢긴 채 울부짖었다. 니들도 사람이가. 그 직후 경찰 사람들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날부터 전기에는 색깔이 스미게 되었다. 필라멘트가 붉게 충혈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이 땅의 전기는 할머니들의 메마른 혈관을 타고 흐른다. 전기의 색깔을 모르는 자의 거처는 외면과 망각이다. 망각은 악의 오랜 친구다.
올해는 70미터 상공 쌍차 굴뚝이 고향이다. 우리 시대 벗들의 고향은 지상에서 가장 높다. 거기도 세상인지 숟가락이 있고 이창근 김정욱 둘이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눈이 내린다고 한다. 먼 고공에서 찍어 보낸 사진은 오늘 우리네 고향이 얼마나 아득한 곳인지 절감케 한다. 그 고향은 설 귀성 열차로는 갈 수 없고 밤샘 암표 고속버스로도 이를 수 없다. 그리하여 굴뚝 연기는 중얼거리고 있다. 노동자도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없이 내일 또는 미래 혹은 21세기는 오지 않는다.
우리네 고향은 왜 자꾸 높아만 가는가. 일제강점기에는 11미터 축대 위 5미터 높이 정자 지붕에 지나지 않았다. 대동강 을밀대에 오른 ‘체공녀’ 강주룡은 9시간30분 동안 고공농성으로도 팔도 대중을 울리고 이윽고 식민지 권력과 자본의 승복을 받아냈다.(1931)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근무시간 연장은 부당하다는 뜻을 내걸고 싸웠는데 팔십여년 뒤 노동자 요구가 이와 한 글자 다르지 않아 뼈끝 시리도록 욕스럽다.
피 한 방울이 10만 볼트인 고향, 눈물 한 방울 낙하 강도가 70미터인 그 허공을 향한 기록이 부활한 건 1990년 울산이었다. 골리앗 크레인 높이 82미터. 이듬해 옥포에서는 104미터였다. 부산 영도에서 김주익은 129일 만에 스스로 허공을 무덤으로 삼아야 했다.(2003) 같은 곳에서 김진숙은 309일이라는 극한을 넘는 시간의 높이에 매달려 있었다.(2011) 때로는 타워크레인 87대(2004), 교통관제용 전광탑(2007)에서 제 몸을 깃발로 삼은 이도 있었다. 벌써 200일 넘게 45미터 스타케미칼 굴뚝에 올라 있는 차광호는 칠곡을 영남에서 가장 높은 지대로 만들고 있다.
연기 내뿜는 굴뚝은 오래도록 산업사회 우상으로 군림해오면서 자본의 남근주의적 기념비 노릇을 해왔다. 그 굴뚝을 우화의 높이로 치환한 건 조세희였다. 그날 이후 아무리 키가 커도 노동자는 난쟁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옥상 철탑 광고탑 굴뚝. 이 겨울 고공은 내쫓긴 자들의 마지막 고향이다. 아무리 높아도 아침마다 깨어나면 낮은 고향이다.
더는 옆으로 갈 수 없을 때, 더는 밑으로도 갈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허공을 타고 오른다. 구사대도 경찰도 올 수 없는 곳, 손배가압류 차압이 없는 곳은 허공뿐인 까닭이다. 도망치던 동물조차 오르지 않는 곳, 번지수가 없는 곳에서야 가까스로 인간일 수 있는 사회에서 정의란 한낱 사치일 따름이다.
해와 달이 아직 없을 때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올 수 있었다. 그 밧줄은 끊긴 지 오래다. 이제 누가 인간세상으로 연결되는 사다리를 놓을 것인가. 땀이 밥이고 눈물이 약인 그 세상 말이다. 그날 굴뚝 위로 해와 달이 다시 뜨리라.
서해성 소설가